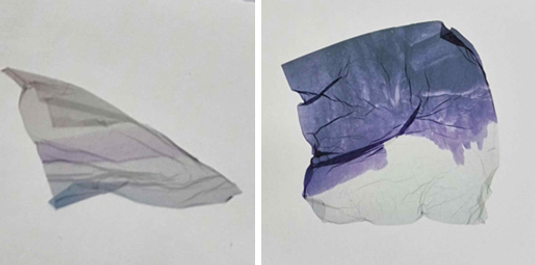2025년 11월, ‘섧[섭]’ 프로젝트는 두 번째 장을 맞이하고 있다. 2024년의 현장 조사와 교류가 해녀들의 삶을 가까이서 기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면, 2025년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각 작가들이 예술적 해석과 창작에 집중한 해였다. 이번 전시는 해녀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온 시간의 심화를 보여주며,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보다 다층적으로 사유한 결과물이다. ‘섧[섭]’은 지역 방언으로 홍합을 뜻하는 ‘섭’과 애달픔의 감정을 품은 ‘섧다’를 결합한 이름이다. 거친 바다에서 생을 이어온 해녀들의 강인함, 그리고 그 이면에 깃든 연민과 슬픔이 이 한 단어에 포개어 있다. 그것은 바다의 언어이자 인간의 기억이 남긴 감정의 결이며, 예술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마주한 현실의 온도이기도 하다.
김소정, 엄경환, 이주영, 임호경, 서인혜, 다섯 명의 작가들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해녀 공동체와의 관계를 지속해왔다. 단순히 관찰하거나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,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며, 그들의 삶 속으로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작가들에게 해녀는 감각을 나누는 동료이자 예술의 출발점이 되었다.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는 각자의 작업 속에 감정과 윤리의 결을 남겼고, 그로부터 새로운 예술적 언어가 태어났다. ‘섧[섭]’의 2025년은 바로 이 관계의 성숙을 담아낸다. 2024년의 체류가 관계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, 올해의 창작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감각과 윤리를 함께 다듬는 시간이었다. 이는 기록 이전의 ‘공존’ 상태를 모색하는 예술적 태도이며, 동시대 리서치형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.
올해 확장된 아카이브 또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. 영상, 사진, 텍스트 등으로 구성된 기록들은 해녀들의 삶을 현대예술의 언어 속에서 재조립하며, 지역적 경험을 세계적 감각으로 번역한다. 이 과정은 예술이 공동체의 기억을 갱신하는 방식에 대한 실험이다. ‘섧[섭]’은 결과보다 과정의 축적에 가치를 둔다. 해녀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리듬과 언어는 지역이 품은 시간의 밀도를 드러내며, 지역예술이 더 이상 주변이 아닌 세계와의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. 바다의 숨결과 인간의 노동, 슬픔과 강인함이 교차하는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, 2025년의 이 전시는 그 흐름의 한 순간을 담은기록이자, 다음 장을 예고하는 시작점이다.